[스페셜경제=권도윤 기자]여행(旅行)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 여행이란 ‘언어’라는 수단으로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막연한 설레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고통, 그럼에도 ‘항해’를 지속하게 하는 알 수 없는 힘.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친 후 원래 있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든다. 아련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는 기분. 이 모든 과정이 여행이고, 이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여행을 결심한다. <편집자주>

마을에서 물레를 돌리며 실을 꼬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시크교 사원 구루바라(Gurudwara)에도 잠시 들렀고 오랜만에 이발도 했다. 요금은 30루피(약 600원). 결과도 딱 그 수준이었다.
숙소에는 전자식 저울이 있었다. 몸무게를 재보니 뭄바이에서 80kg로 출발했는데 72kg다. 보름만에 8kg가 빠진 것이다. 장염과 자전거주행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다. 전체 짐 무게는 33.5kg가 나왔다.
계속해서 북쪽으로 페달을 밟았다. 길에서 염소 한떼를 만났다.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염소가 재미있어서 한참을 구경했다. 그런데 우직하게 갈길 가는 소에 비해서 염소떼는 제멋대로다. 한 녀석은 가다가 풀을 뜯고 있고 다른 녀석은 엉뚱한 길로 새는 등 정말 말을 안듣는다. 이솝우화 등에서 염소가 주로 나쁜쪽으로 묘사는 이유를 알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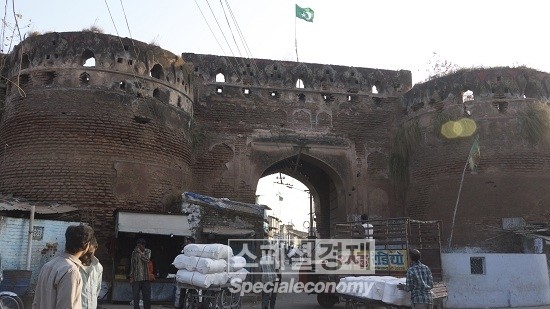
즐거운 기분도 잠시, 얼마 후 바퀴살 하나가 또 부러졌다. 가만히 살펴보니 오르막에서만 부러지고 있다. 언덕길을 기피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마침 야트막한 언덕 위에는 짜이(인도식 차) 가게가 있었다. 짜이 한잔을 주문하고 자전거 정비를 시작했다.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외딴 곳이었지만 이곳에도 구경꾼은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선가 나타난 주민들은 “뻔쪄르, 싸이끌 뻔쪄르”라고 외친다.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타이어 펑크(Puncture)를 인도식으로 읽은 것이다. 한국에서 배운 Flat Tire라는 표현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자전거를 고치며 구경꾼들의 말을 받아주다 보니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다. 대신 ‘한라공조’가 새겨진 외투를 입은 주인과 친해졌다. 그 새 해가 넘어가려 하자 호기심을 만족시킨 구경꾼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주인의 허락 덕분에 가게 울타리 한구석에 텐트를 쳤다.
울타리는 나무 뼈대를 세우고 소똥으로 미장했다. 말 그대로 ‘벽에 똥칠’해놓았으나 완전 건조되어 악취도 없고 의외로 따뜻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울타리 위를 보니 닭 횃대가 있었다. ‘아, 편히 자기는 틀렸구나’
예상대로 닭은 새벽 4시가 채 안되어 울기 시작했다. 아직 어두컴컴하고 추워서 침낭 속에서 빈둥거리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다. 텐트 밖으로 나가면 조용해지는데 텐트에 들어서면 다시 운다. 결국 닭의 성화에 못이겨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대충 아침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퀴살이 부러졌다. 이번이 4개째다. 응급조치를 하고 한동안 달렸으나 또 다른 바퀴살이 부러진다. 이번에는 스프라켓(뒷바퀴 톱니바퀴 결합체) 쪽이다.
이걸 교체하려면 스프라켓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데 필요한 공구도 없다. 바퀴살이 끊어지니 바퀴가 출렁출렁한다. 더 이상 전진도 불가능하다.
하긴 전체 무게의 70% 이상을 지탱하는 뒷바퀴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가 부러지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니 나머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연쇄적으로 부러지는 것이다. 임시방편을 찾아도 금세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과연 얼마나 더 갈수 있을까?

고민을 이어가며 지도를 보니 30km정도만 가면 옴카레슈와르(Omkareshwar)가 나온다. 거기서 인도르(Indore)라는 대도시가 멀지 않다. 옴카레슈와르로 가면 조금 돌아가는 셈이지만 가볼만 하다고 추천받은 적도 있었다.
‘그래, 바퀴살이 부러지던 바퀴가 휘던 일단 옴카레슈와르까지 가보자. 숙박료가 싸다는 옴카레슈와르에 짐을 맡기고 인도르에서 부품을 찾아봐야겠다’
조심조심 달려 마침내 옴카레슈와르에 진입했다. 앞서 추천받았던 가네샤 게스트하우스도 찾기 쉬웠다. 숙박비는 독방이 단 100루피(약 2,000원). 이정도면 베이스캠프로 적격이다.
‘인도르를 싹 뒤져서라도 부품을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힘들었던 하루를 정리했다.

